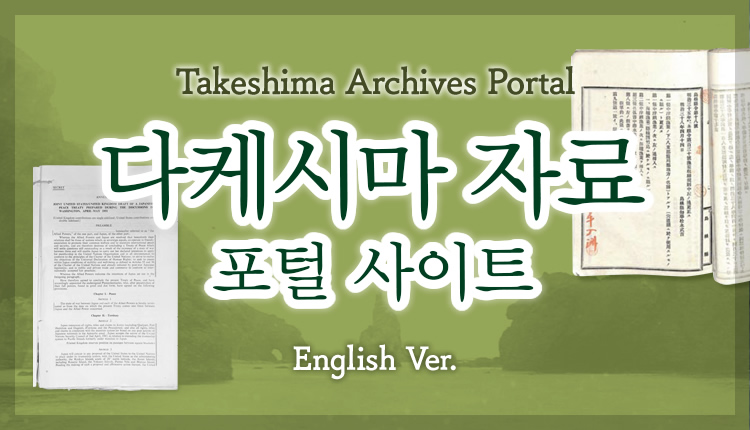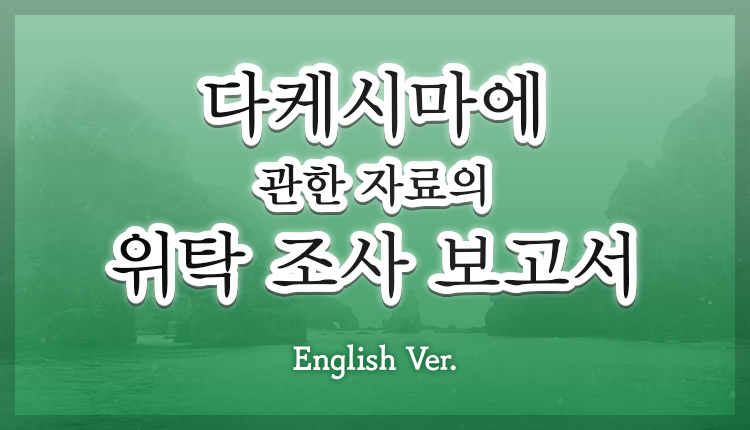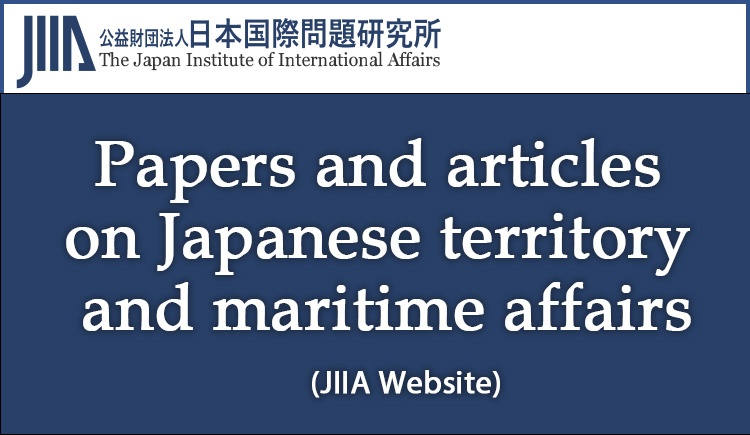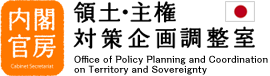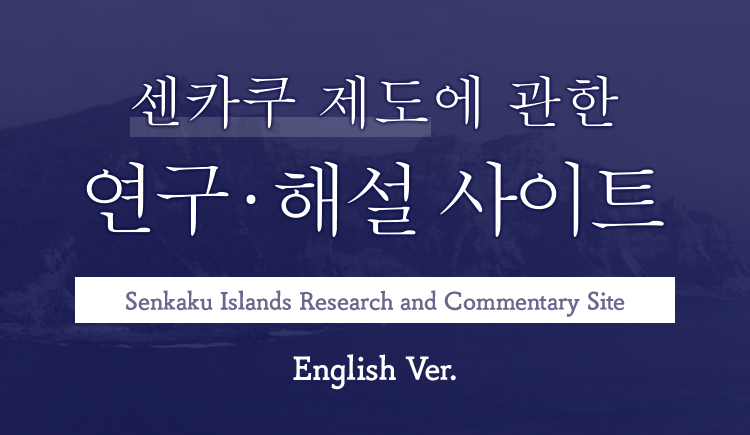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별 주제 해설
칼럼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각국 주일 대사관의 인식
후지이 켄지(藤井 賢二)(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고문)
※PDF 파일을 확인하시려면 Adobe사가 제공하는 ‘Adobe Acrobat Reader DC’가 필요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머리말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하 ‘평화조약’이라 한다)에 의해 다케시마의 일본 보유가 결정된 것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논점 해설: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의 취급’(본 사이트에 2022년 10월 11일 게재) 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각국 주일 대사관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볼드 주일 미국 정치 고문의 본국 보고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이승만 라인 선언(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넓은 해역에 어업관할권(어업을 연안국만이 관할할 수 있는 권리)과 주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달 28일에 이 선언에 항의했고, 이 해역 동쪽 끝에 다케시마가 있어 다케시마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12일에 이에 대해 반박했고, 일본 정부는 같은 해 4월 25일에 재반박했다.
시볼드(William Joseph Sebald, 1901~1980) 주일 미국 정치 고문(주일 미국 대사에 해당한다. 당시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주일 대사라는 직위는 없다)이 1월 29일자로 미국 국무부에 보낸 보고1 가 있다. 시볼드는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 이하 ‘총사령부’라 한다)의 외교국장을 겸하고 있었다.
보고의 Part Ⅰ에서 그는 전날의 일본 정부 항의문2 을 소개하고, Part Ⅳ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이 이승만 라인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킴에 따라 이 섬의 영유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본은 SCAPIN에 의해 이 섬에 대한 정치상 및 행정상의 관할권을 빼앗긴 상태이다. 그러나 제외함으로써 평화조약의 문구는 영유권을 일본에 남겨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는 총사령부나 연합국과 관계없이 일한 간 협상의 의제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SCAPIN이란 1946년 1월 29일에 총사령부가 내린 지령, 즉 SCAPIN-6773 을 말한다. 그것은 다케시마를 제주도 및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단, 이 지령이 일본 영토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SCAPIN-677 자체에 기재되어 있었다. 일본의 영토를 최종 결정한 것은 1951년 9월 8일 서명한 평화조약이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평화조약의 문구는 영유권을 일본에 남겨둔 것처럼 보인다(by exclusion, terms of Peace Treaty appear reserve sovereignty to Japan)’는 문구이다. 여기에서 ‘제외’란 SCAPIN-677의 ‘울릉도, 다케시마, 제주도’라는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과 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의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교했을 때 평화조약에는 다케시마가 빠져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볼드는 1949년 11월, 미국 국무부의 평화조약 초안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가 조선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국 국무부에 수정을 요구했다4 .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12월 작성된 평화조약 초안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이 보유하는 섬으로 수정되었다. 그 후 일본이 보유하는 섬을 열거한 조항은 없어졌지만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남긴다는 미국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다. 1951년 8월에는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요청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문(‘러스크 서한’)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면서 이 요청을 거부하였다. 시볼드가 이러한 경위를 몰랐음을 이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는 평화조약에서 일본 영토로 남겨졌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집요한 로비로 한 때 미국무성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재하기도 했다.’(‘독도는 한국땅이다’의 Ⅲ장 ‘전후 연합국의 조치로 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동북아역사재단 웹페이지 게재)5 ) 등과 같은 비난이 있다. ‘로비’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시볼드를 이용해 미국 국무부를 설득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미국 국무부는 시볼드의 의견도 참고했겠지만 자신들의 정보와 판단에 따라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시볼드의 보고는 이러한 사실을 부각시킨다.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도록 1951년 7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기록(17일에 변영태 한국 외무부 장관이 무초 주한 미국 대사에게, 19일에 양유찬 주미 한국 대사가 덜레스 국무장관 고문에게)6 은 주일 미국 정치고문부에도 보내졌다. 또한 돗토리현립 사카이 고등학교의 실습선 ‘아사나기마루’ 승무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국의 신문 보도를 정리한 같은 해 11월 28일자 주한 미국 대사의 국무부 보고7 역시 주일 미국 정치고문부에 보내졌다. 해당 보고에는 ‘독도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의 섬으로 특별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한 섬 중 하나였음을 상기시킨다’고 기재되었다. 이들 정보에 대한 언급이 시볼드의 보고에는 없다는 것은 이승만 라인 선언으로 다케시마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는 그가 다케시마에 대한 관심이 적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다케시마에 대해 1949년 국무부에 설득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즉 일본 정부의 ‘집요한 로비’를 담당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주1
1950-52: 322.2 Boundary Waters (NARA, RG84 Records of Office of the U. S. Political Advisor for Japan, Tokyo Box No.64 Folder No.8). 원자료는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주일 미국대사관 영사관·정치고문부 문서」 청구 기호 FSP 0337.
주2
「1952년(쇼와 27년) 1월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에 대해 같은 달 28일자로 일본국 정부가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구술서)」(‘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자료 번호 T1952012800101).
주3
「약간의 외곽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건(SCAPIN-677)」(앞과 동일 T1946012900101).
주4
쓰카모토 다카시 「평화조약과 다케시마(재론)」(『레퍼런스』 518 국립국회도서관 조사입법고사국 1994 년 3월) 41~43쪽.
주5
독도는 한국땅이다 Ⅲ. 2. 미 국무성과 영연방의 입장에서본 독도의 위치
발행일 : 2008.7
2024년 7월 24일 마지막 열람.
주6
1950-52: 320.2 Peace Treaty, June – July 1951 (NARA, RG84 Records of Office of the U. S. Political Advisor for Japan, Tokyo, Box No.62 Folder No.1). 원자료는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주일 미국대사관 영사관·정치고문부 문서」 청구 기호 FSP 3781.
주7
1950-52: 322 Territory (NARA, RG84 Records of Office of the U. S. Political Advisor for Japan, Tokyo, Box No.7 Folder No.10). 각주 (6)의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주일 미국대사관 영사관·정치고문부 문서」 청구 기호 FSP 0560。
2. 주일 영국 대사관의 본국 보고
1953년 5월 28일 시마네현 수산시험장 시험선 ‘시마네마루’의 승무원은 다케시마에서 한국인의 활동을 확인했다8 . 같은 해 6월 27일, 시마네현과 해상보안청은 합동으로 다케시마 조사를 벌여 상륙한 한국인에게 퇴거를 권고하고 일본 영토라는 표지를 설치했다9 . ‘독도침해 사건’이라며 일본의 다케시마 조사에 반발한 한국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일본에 강경한 자세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같은 달 12일, 다케시마에서 일본 순시선에 대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10 . 다음 날인 13일,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항의함과 동시에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견해를 담은 구술서를 한국 정부에 송부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두 차례에 걸친 항의의 응수가 있었고, 같은 해 9월 9일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견해에 대한 반론을 담은 구술서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
1953년 7월 1일자로 주일 영국 대사관이 보낸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영국 외무성 보고 11 에는 ‘우리는 공식 간행물에서 그 섬(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자세한 역사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18세기 초 일본인 여행자들이 울릉도로 향하는 도중에 발견된 듯하다.’ ‘울릉도와 다케시마에 붙여진 명칭에는 다소 혼란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마쓰시마라는 명칭은 또한 다케시마에도 사용된다.’고 기록되었다. 글 속의 ‘18세기’가 ‘17세기’의 오류인 것처럼 영국 대사관은 에도 시대(1603~1868)의 다케시마 이용을 비롯한 일본의 역사적 근거나 1905년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시의 섬 명칭 교체 등과 같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단, 영국 대사관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같은 달 5일자 『아사히 신문(시마네판)』에도 시마네현의 ‘도쿄 사무소에서는 영국 대사관으로부터 영토 귀속에 대한 조회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1953년 7월 15일자로 주일 영국 대사관이 보낸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영국 외무부 보고12 는 같은 달 12일 다케시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와 일본 정부의 영유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은 이틀전인 13일에 일본 정부가 내세운 견해13 의 다음 주장과 같았다.
일본 정부의 견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의 취급에 대해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1952년 2월 12일자 반론에서 한국 정부의 영유 근거가 SCAPIN-677과 SCAPIN-1033뿐이었기 때문이다. SCAPIN-103314 이란 총사령부가 일본 어선의 조업한계선(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개정하여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인의 접근이나 접촉을 금지한 1946년 6월 22일자 지령이다. 일본 정부는 SCAPIN-677과 SCAPIN-1033에 대해, 이들 지령 자체에 일본 영토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전제로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대사관의 7월 15일자 보고는 전날 14일자 『요미우리 신문』 석간이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미영 양국에 중개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15 사실을 다루고 있다. 이어서 일본 정부 외무성의 요청은 아직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이 확실하므로 그때는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보고했다. 중요한 것은 보고 마지막의 다음 부분이다.
5. 한편, 귀하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중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쌍방에 각자의 입장 제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서명국으로 되어 있는 평화조약 제2조에서 다케시마는 틀림없이 일본 영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대사관의 인식은 ‘당장(preliminary)’이라고 하면서도 ‘다케시마는 틀림없이 일본 영토의 일부를 형성한다(Takeshima unmistakably forms part of Japaneseterritory)’는 것이었다. 이 역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견해에서 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케시마는 ‘이미 일한 병합 이전에 시마네현의 행정 관할하에 있었으며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놓인 적은 없었다’. 제2조 a항에서 말하는 ‘독립된 조선’에 일본 영토였던 다케시마를 할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2조 a항에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열거한 것은 ‘독립된 조선’에 이들 세 섬이 포함됨을 ‘만약을 위해’ 밝힌 것이며 일본 영토였던 다케시마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국 대사관의 담당자는 “it appears”, “it seems”, “the texts indicate” 등과 같은 애매함이 포함된 어구가 아니라 "unmistakably"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해 일본의 영유 주장을 지지했다. 한국의 영유 근거가 SCAPIN-677과 SCAPIN-1033밖에 없으며, 게다가 그것이 일본 정부에 의해 명확하게 부정된 상태에서 이는 타당한 평가였다.
주8
관련 신문 기사로 1953년 5월 31일자 『마이니치 신문』(오사카) 「‘다케시마’에 한국인 상륙」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자료 번호 T1953053100102), 동년 6월 4일자 『마이니치 신문(시마네판)』 「‘다케시마의 한국 어선’은 영해 침범인가, 조사 후 엄중 항의: 고다키(小瀧) 외무 차관의 말」(앞과 동일 T1953060400102).
주9
「시마네현·해상보안청 합동 다케시마 조사 '복명서'」(앞과 동일 T1953062800103).
주10
관련 신문 기사로 1953년 7월 14일자 『산인 신보』 「다케시마에서 순시선 발포당하다」(앞과 동일 T1953071400202).
주11
Japanese claim to Takeshima Island, also claimed by the Republic of Korea (TNA, FO371/105378, Code FJ file 1082). 원자료는 영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영국 외무부 본부 일반 정무 문서 일본 파일 1952-1974」 청구 기호 BFO-2.
주12
각주 (11)과 동일. 『2017년도 내각관방 위탁 조사: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STREAMGRAPH inc. 2018년 3월) 36~37쪽.
주13
외무성 정보문화국 「기사 자료」 시마네현립도서관 소장.
주14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에 관한 건(SCAPIN-1033)」((‘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자료 번호 T1946062200101).
주15
각주 (12)와 동일. 『2017년도 내각관방 위탁 조사: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 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