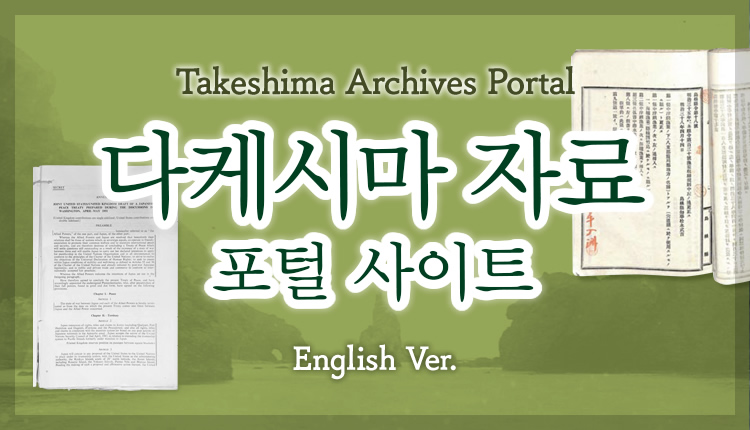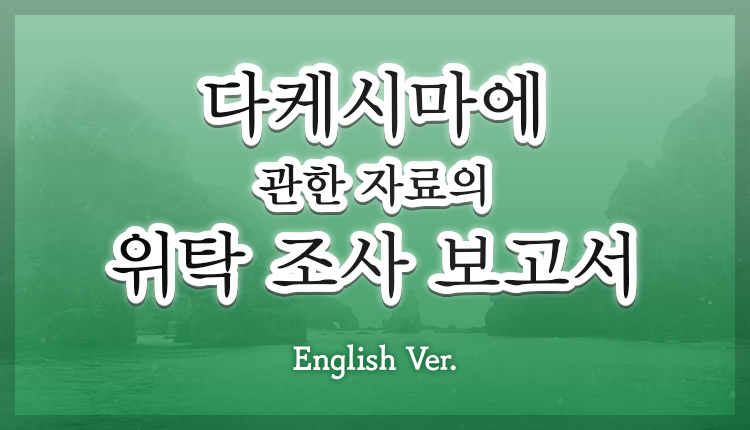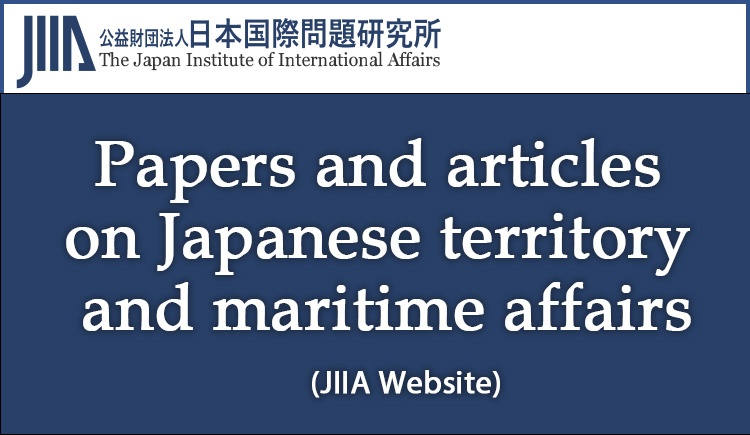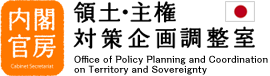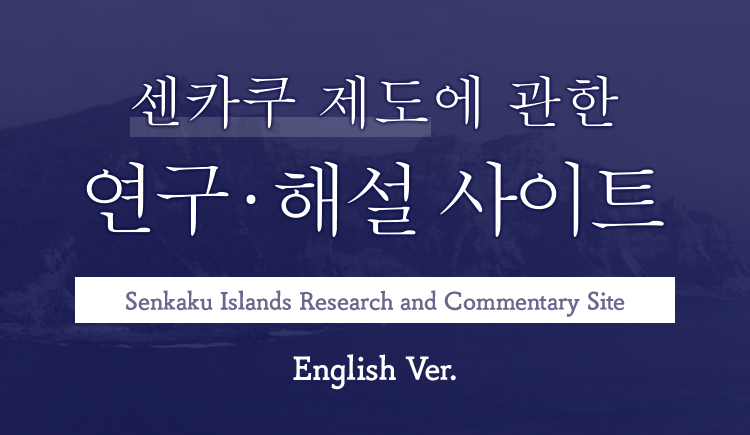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별 주제 해설
3. 국제법상의 평가
(1) 각의 결정(1905년)의 법적 성질
일본 정부는 ‘늦어도 에도 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한다16. 그렇다면 왜 각의 결정에 따라 이미 영유권을 확립한 다케시마에 대해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했을까. 그것은 예로부터 공통의 인식에 의해 인정되어 온 역사적 권원17 을 근대 국제법이 요구하는 권원으로 ‘대체18’ 혹은 ‘교체19’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속해 있던 동아시아 세계 질서에서는 유럽 국제 질서의 기반이었던 ‘영역(territory)’에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동아시아 세계 질서의 기반은 ‘판도(domain)’였다20. 그러므로 영역 개념에 기초한 유럽 기원의 근대 국제법을 일본이 수용하는 데 있어, ‘판도’ 개념 하에서 소유하고 있었다고 간주되는 역사적 권원을 ‘영역 권원’으로 ‘대체’ 혹은 ‘교체’해야 했던 것이다21.
이 같은 ‘재확인’의 필요성은 국제재판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망키에·에크르오 사건에서 분쟁 지역에 대해 프랑스 왕이 시원적인 봉토권(original feudal title)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체 시점에 유효한 다른 권원으로 대체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늘날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22.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세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도출한 간접적인 추정이 아니라’ 분쟁 지역에 대한 ‘점유에 직접 관련된 증거’이기 때문이다23. 에리트레아와 예멘의 분쟁에 관한 중재 판결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24.
망키에·에크르오 사건은 유럽 국제 질서에 속하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사건, 에리트레아/예멘 중재는 이슬람 국제법 체계에 속하는 국가 간의 사건이지만, 양쪽 모두 근대 국제법 체계와 전혀 다른 법체계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서 제시된 견해는 동아시아 세계 질서에서 전통적 국제법 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에도 적용된다25. 요컨대 근대 국제법은 동아시아 세계 질서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가 근대 국제법을 수용하고 유럽 국제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던 역사적 권원을 강화하기 위해, 또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재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26. 오히려 근대 국제법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영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당시 유효했던 권원을 ‘대체’ 혹은 ‘교체’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2) 영유 의사의 표시 형식
시마네현의 고시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일본의 일반 국민’은 이를 알고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시마네현의 고시는 시마네현 전역에 발표되었으며 당시 신문에서도 보도되었기 때문이다(본고 1 참조).
다음으로, ‘일개 지방 정부에 의한 고시’이며 ‘정식 외교 절차를 통해 당시의 한국 정부에 통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영유 의사 표시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토지에 대한 주권의 표시가 있다면 영유 의사가 추정되므로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27. 어쨌든 지방 관청에 의한 고시라는 방식은 당시의 관례이며28, 국가 기관이 다케시마의 소속을 명확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 영유 의사를 적절히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규칙이 없는 한 외국 정부에 대해 영유 의사를 통고할 의무는 없다29. 이러한 법규칙으로는 1885년 베를린 회의 일반 의정서가 있다. 이 의정서의 34조는 선점 요건으로 ‘당사국은 서로 통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정서의 효력은 아프리카 대륙 해안에 국한되어 있어30 동아시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일찍이 저명한 국제법학자는 국제법상 상술한 ‘당사국은 서로 통고하도록 한다’는 규칙이 ‘머지않아 관습 또는 조약에 의해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언했다31. 그의 예언은 빗나갔고 그러한 범위 확대는 일어나지 않았다32.
주16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문제의 10가지 포인트』(Point 3: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p.8, 에서 다운로드 가능. 일본 외무성,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정세: 다케시마 『다케시마의 영유』 4」, 에서 열람 가능.
주17
마쓰이 요시로(松井 芳郎), 『국제법학자가 읽는 센카쿠 문제』(일본평론사, 2014년), p.50 *1.
주18
미나가와 다케시(皆川 洗), 「다케시마 분쟁과 국제 판례」 마에하라 미쓰오(前原 光雄) 교수 환갑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국제법학의 여러 문제(마에하라 미쓰오 교수 환갑 기념)』(게이오 통신, 1963년), p.363.
주19
다이주도 가나에(太寿堂 鼎), 「다케시마 분쟁」(1966년 초출) 『영토 귀속의 국제법』(도신도, 1998년), p.143.
주20
마쓰이, 『전게서』(주17), p.115. ‘판도’는 ‘동아시아의 “국제적” 규범 질서’에서 타당한 개념이었다. 박배근(朴培根), 「일본에 의한 도서 선점의 여러 선례: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역 권원을 중심으로」 『국제법 외교 잡지』 105권 2호, pp.32-33.
주21
마쓰이,『 전게서』(주17) p.118.
주22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Judgment of November 17th, 1953 : I.C. J. Reports 1953, p. 56.
주23
Ibid., p. 57. See also, Sahara occidental, avis consultative, C.I.J. Recueil 1975, p. 43, para. 93.
주24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first stage of the proceedings between Eritrea and Yemen (Territorial Sovereignty and Scope of the Dispute), Decision of 9 October 1998,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ume, XXII, 245, para. 131, p. 268, para. 239.
주25
마쓰이, 『전게서』(주17), p.124.
주26
박, 「전게 논문」(주20), p.38.
4. 맺음말
이상의 검토를 통해 한국 정부의 주장에는 국제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의 결정을 거쳐 취해진 일련의 편입 조치는 당시의 국제법에 따른 것이며 ‘그 이전에 일본이 다케시마를 영유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타국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또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유효하게 실시된 것이다’.
끝으로, ‘어쨌든 1900년에 반포된 ‘칙령 제41호’ 규정에 따라 ‘계속 독도를 관할하며 영토 주권을 행사해 온 것은 명백’하며 일본에 의한 편입 조치는 ‘오랫동안 공고히 확립된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로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효력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검토한다 (본고 1 참조).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격상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는 제2조에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도 전체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기했다고 주장한다33. 무엇보다 원문에는 ‘(독도)’ 표기가 없기 때문에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왜 ‘석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나’라는 의문이 생긴다34.
가령 이 의문이 해소되어 석도가 다케시마를 지칭한다 하더라도 칙령 공포 전후에 대한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사실은 없으며 한국에 의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이 설령 다케시마에 어떠한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실효적 점유에 근거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못했다.
반면 ‘일본 정부에 의한 1905년의 영토 편입 조치와 그에 이은 지속적인 주권의 표시는, 17세기 당시의 국제법에도 거의 부합하여 유효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권원을 현대적 요청에 따라 충분히 대체하는 것이었다’ 35. 따라서 편입 조치는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 등이 결코 아니다. 근대 국제법의 규칙을 충실히 따르며 이루어진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조치이다.
주27
다이주도, 「전게 논문」(주19), p.144.
주28
「다케시마에 관한 1954년 9월 25일자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일본국 정부의 견해」(1956년 9월 20일). 쓰카모토, 『레퍼런스』(주7), p.62.
주29
Island of Palmas Case (Netherlands/United States of America), Award of 4 April 1928,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II, p. 868.
주30
Affaire de l’île de Clipperton (Mexique contre France), 28 janvier 1931,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II, p. 1110.
주31
L. Oppenheim, International Law : A Treatiese, 1905, §224., pp. 278-279.
주32
Lindley, M. F., The Acquisition and Government of Backward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1926, p. 295.
주33
한국 외교부, 『전게서』(주9), p.9.
주34
일본 외무성, 『전게서』(주16)(Q4: 1905년 일본 정부의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 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p.24,、 에서 다운로드 가능. 일본 외무성,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정세: 다케시마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6」, 에서 열람 가능.
주35
다이주도, 「전게 논문」(주19), p.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