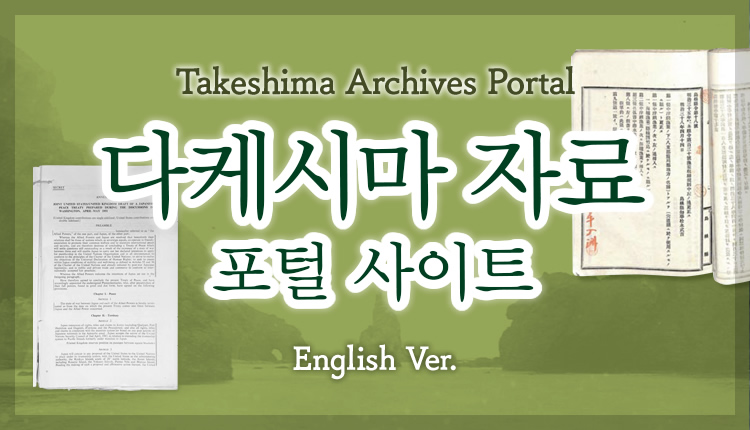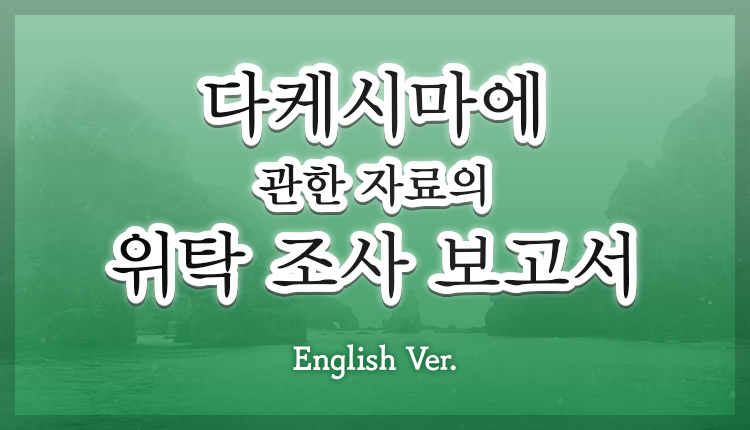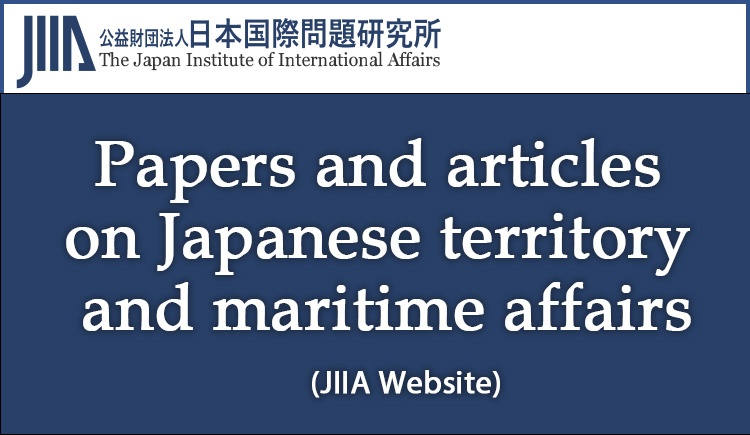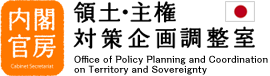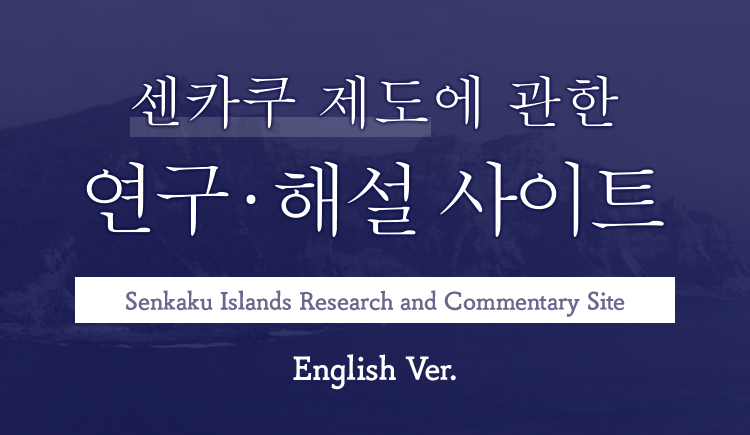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타국 주장 분석
5. 지리서 편찬룰에 따른 해석법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則可望見”은 문구로서는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우산 무릉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은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고 읽힙니다. 그러나 지리서 기술로서는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 정부가 각 도에 지리서 편찬을 명령(상기 3)했을 때 각 도가 편찬한 지리서를 합쳐 나라 전체의 지리서를 만들기 위해 기술 방식에 일정한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경상도지리지에서 섬은 육지로부터의 거리와 사람의 거주, 농작 여부(諸島陸地相去水路息数及島中在前人民接居農作有無)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영해 (寧海)의 축산도에 대해 육지로부터 2백보 거리에 있고 농작을 할 수 있는 땅은 없다고 (陸地相去水路二百歩無可耕之地) 기록하였습니다5. 이 기술 지침은 직접적으로는 경상도지리지를 위한 것이지만, 가령 이 기술 방식에 따라 세종실록지리지를 읽으면 “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은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관한 기술로 해석됩니다. 즉 우산 무릉이 조선반도에서 보인다(외딴섬이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 보이는 거리에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실제로는 울릉도는 보여도 다케시마는 조선반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지 않으므로 우산은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주5
각주 4의 복각판, p. 19. 또한 기술 지침(‘규식’)에 대해서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케시마는 일한 어느 쪽의 것인가』 분슌신쇼, 2004, pp. 162-166으로.
6. 신증동국여지승람 기술에서 도출되는 결론
날씨가 맑은 날에 '보이는 대상'이 다케시마가 아니라 울릉도라는 것, 즉 (울릉도에서 우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울릉도를 본다는 의미라는 점은 한국 정부가 소책자에서 인용한(상기 2 밑줄 부분③)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의 기술에 의해 더욱 명백해집니다6.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우산도 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며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세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게 하늘을 떠받치며, 남쪽 봉우리는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 맨 꼭대기의 수목 및 산기슭의 물가가 역력하게 보인다. 순풍이면 이틀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라고도 한다. 땅은 방백리이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자료 2). 여기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지리지의 “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술을 “세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게 하늘을 떠받치며, 남쪽 봉우리는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 맨 꼭대기의 수목 및 산기슭의 물가가 역력하게 보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두 섬이 현의 바로 동쪽 해상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뒤로 이어지는 “세 봉우리가 높고” 이하의 기술은 울릉도 한 섬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되고,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 맨 꼭대기의 수목과 산기슭의 물가가 역력하게 보인다고 기록한 것입니다(다케시마는 암초섬으로 수목은 없습니다).
주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5, 서울: 동국문화사 간행의 영인본, 1958, p. 814.
자료2
『新増東国輿地勝覧』巻四十五蔚珍県山川条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5,
이미지 열기 >>
<번각>
于山島 欝陵島 [分注]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岌嶫撑空 南峯稍卑 風日清明 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歴歴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説于山欝陵本一島 地方百里 新羅時恃險不服 智證王十二年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國人愚悍 難以威服 可以計服 乃多以木造獅子 分載戰艦 抵其國 誑之曰 汝若不服則即放此獸 踏殺之 國人懼來降 高麗太祖十三年 其島人使白吉土豆 獻方物 毅宗十三年 王聞欝陵島地廣土肥 可以居民 遣溟州道監倉金柔立往視 柔立回奏云 島中有大山 從山頂向東行至海一萬餘歩 向西行一萬三千餘歩 向南行一萬五千餘歩 向北行八千餘歩 有村落基址七所 或有石佛 鐵鐘 石塔 多生柴胡 蒿本 石南草 後崔忠獻獻議 以武陵土壌膏沃 多珍水海錯 遣使往觀之 有屋基破礎宛然 不知何代人居也 於是移東郡民以實之 及使還 多以珍木海錯進之 後屢爲風濤所蕩覆 舟人多物故 因還其居民 本朝 太宗時 聞流民逃其島甚多 再命三陟人金麟雨 爲按撫使刷出空其地 麟雨言 土地沃饒 竹大如杠 鼠大如猫 桃核大於升 凡物稱是 世宗二十年 遣縣人萬戸南顥 率數百人 往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 而還 其地遂空 成宗二年 有告別有三峯島者 乃遣朴宗元 往覓之 因風濤 不得泊而還 同行一船 泊欝陵島 只取大竹大鰒魚 回啓云 島中無居民矣
『新増東国輿地勝覧』八道総図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이미지 열기 >>
7.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으로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6세기 초(512년)에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상기 2 밑줄 부분②)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가 독도를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에 반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상기 3)에 다케시마에 관한 기술은 없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신라 때 우산국이라 칭하였다.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방백리이다”는 부분은 『삼국사기』7(1145년) 신라본기 제4 지증왕 13년 여름 6월의 기록인 “우산국은 명주(溟州)[훗날의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에 있다.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방백리” (원문은 자료 3)를 베낀 것입니다. 또한 ‘이사부(인명)가 나무로 맹수를 만들어 우산국인을 항복시켰다’ 운운하는 부분도 삼국사기의 우산국, 즉 울릉도에 관한 이야기이며, 고려 태조 13년에 섬사람이 특산물을 진상했다는 기록도 그 섬은 주민이 있으므로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의종 13년 김유립이 큰 산이 있고 촌락 주거지가 일곱 군데 있다고 보고한 섬도, ‘땅이 비옥하고 기둥처럼 굵은 대나무가 자라는 섬’도 암초섬인 다케시마일 수 없으므로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섬이 6세기 초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8.
주7
『삼국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려 인종 23년, 김부식 등 편찬 (전술한 다가와의 논문, 각주 3으로). 『삼국사기』 학습원동양문화연구소 (학동총서 1), 1964, p. 33-34.
자료3
『三國史記』新羅本記第四 智證王十三年条
『삼국사기』신라본기 제4 지증왕 13년
이미지 열기 >>
<번각>
十三年夏六月 于山國歸服 歳以土冝爲貢 于山國 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飡異斯夫 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舩 柢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주8
『동국문헌비고』 「여지고」(1770년)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며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주장(2 밑줄 부분④)을 통한 논의일 가능성이 있으나, 18세기의 견해를 근거로 15세기 문헌을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동국문헌비고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시모조의 서적(각주 5), pp. 100-103 참조.
8. 결론: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은 다케시마가 아니다
아울러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상기 3)에 이름이 있는 안무사 김인우가 간 섬은 주민이 다수 있었으니 울릉도이며 다케시마(암초섬)일 수 없지만, 태종실록은 김인우가 갔던 섬을 ‘우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9. 태종 17년(1417년) 2월 임술조에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산물인 큰 대나무(大竹), 물소 가죽, 생모시[종이 원료], 면자(綿子), 검박목(檢樸木) 등의 물품을 바치고 거주민 3명을 이끌었다. 그 섬의 호수(戶數)는 대략 15, 인구는 남녀 합해서 86. 인우가 왕래했는데, 다시 폭풍을 만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자료 4).
이러한 것으로 보아 우산도의 실체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라 때 우산국이 울릉도에 있었는데(울릉도=우산국) 어느덧 우산이 섬의 명칭으로 여겨지게 되어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 울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내용은 당연하게도 울릉도 한 섬에 한정되는 것에 그쳤고, 태종실록의 김인우 기사처럼 15세기에 ‘우산도’가 울릉도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도]은 가공의 섬이거나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지 다케시마는 아닙니다.
<붙임>
또한 18세기 이후의 조선 지도에 그려진 우산[도] 중에는 조선국 관리가 정기적으로 울릉도를 순검하게 되면서 울릉도 동쪽 2km에 있는 작은 섬을 인지하게 되어 그 섬을 우산도로 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료 5). 이 우산도는 조선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려진 가공의 우산도(예: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자료 2)와는 달리 울릉도 동쪽에 실재하는데, 한국에서 죽도, 일본해군수로부의 수로지에서 죽서 등으로 불리는 작은 섬일 뿐이며 이것 역시 다케시마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