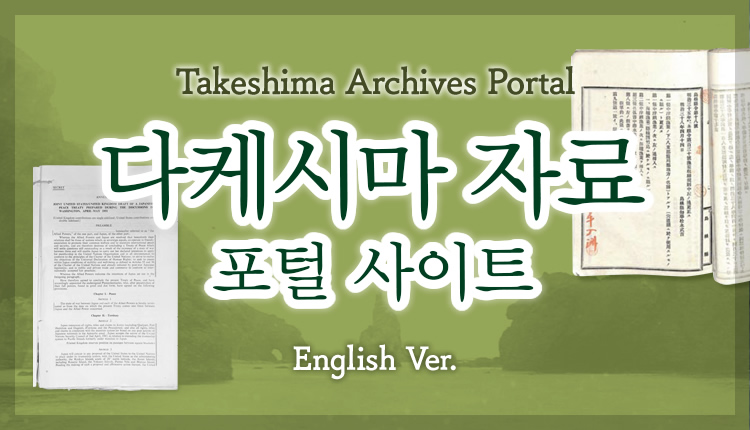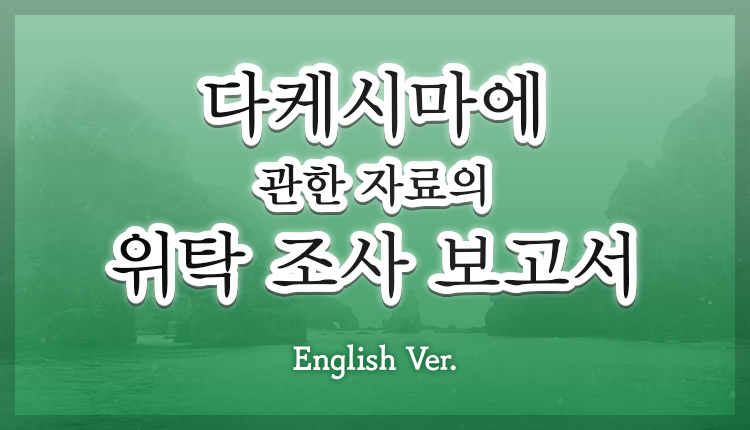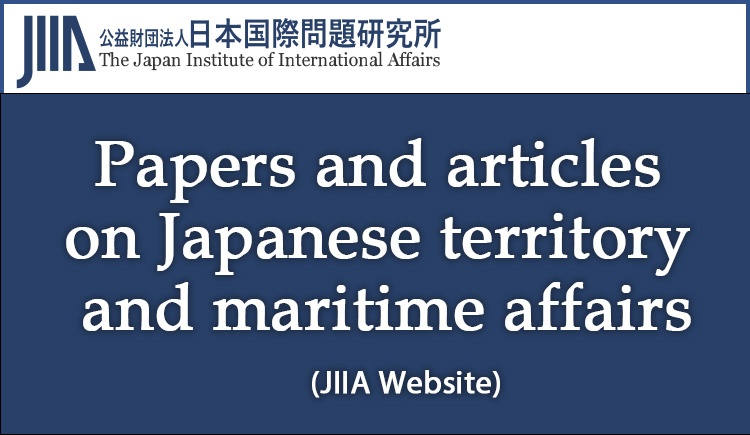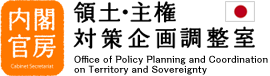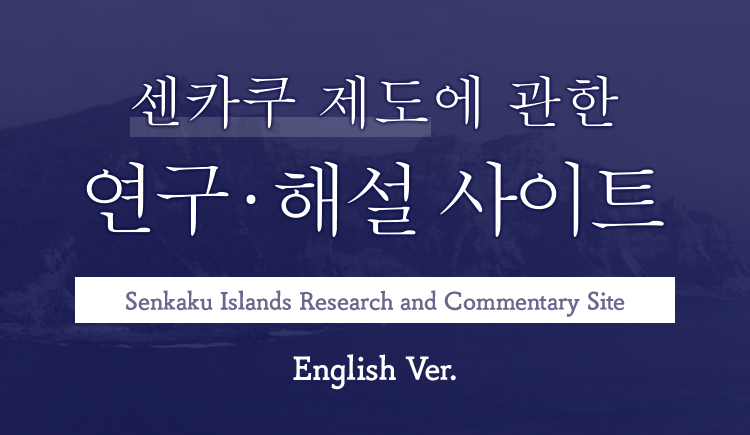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별 주제 해설
4. 평화 조약의 영토 조항과 호주
1951년 7월 20일자 부산의 플림솔(호주 외교관으로 당시 UNCURK(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 호주 대표로 임명되었다)은 호주 외무성 앞으로 보낸 전보 No.3811 에서 ‘한국 외무장관은 일본과의 평화 조약 초안에 대한 네 가지 수정에 관해 우리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그 네 가지 중 (a)는 평화 조약 초안 제2조 (a)의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 뒤에 '일본의 한국 병합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모든 섬들'을 삽입한다. 또한 특히 독도 및 프랑도의 명칭을 기재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같은 해 7월 19일자 양유찬 주미 한국 대사가 애치슨 미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다케시마를 요구했는데, 같은 시기에 호주에 비슷한 요청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발굴된 것이다.
호주 외무성이 플림솔에 보낸 1951년 7월 25일자 전보 No.3212 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 귀하를 중개자로 이용하는 한국 정부의 방식에 의문을 느끼지만, 한국 외무장관에게 그가 시사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수정에 대한 우리의 잠정적인 반응을 완전히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정도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제안한 수정이 현실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한국 정부가 조약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귀하는 (한국에: 후지이의 보충 주석) 말해도 좋을 것이다’고 하였다. 호주는 한국을 위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호주 외무부는 ‘귀하가 말하는 두 섬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선 지도에서도 찾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 국무부 지리 전문가) 보그스 씨가 말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에 있는 모든 자원을 찾아보았으나' … 독도와 파랑도를 특정하지 못했다'거나, ‘(국무부 조선 담당관) 프렐린 휴센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독도는 울릉도 또는 다케시마 근처일 것이며 파랑도 또한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는 미국의 기록13 과 많이 흡사하다.
뉴질랜드 정부 외무부가 작성한1953년 12월 2일자 자료 '일한 관계, 특히 다케시마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중 '다케시마 분쟁'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호주로 보낸 1951년 7월 21일자 전보 중 한국 외무부 장관이 호주에 요청한 내용에 관한 기록이 있다14. 이 기록에는 한국 외무부 장관이 '독도'와 '파랑도'를 한국 영토로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 두 섬은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다(these two islands were some distance to the south of the mainland)’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은 ‘독도’와 ‘파랑도’의 정확한 위치조차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미국, 호주 양국이 한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화 조약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및 이를 조약 초안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정리한 1951년 8월 7일자 미 국무부 문서(Treaty Changes)15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제2조 (a)에 '독도'와 '파랑도'의 추가 표기를 요구한 국가는 한국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하는 것은 한국만의 생각이며 다케시마 영유권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주11
Amendments to Draft Japanese Peace Treaty 27th July, 1951 (NAA, Item ID: 140412, Japanese peace settlement). 2021년도 보고서 게재 자료. ‘프랑도’=Prangdo는 ‘파랑도’=Parangdo일 것이다.
주12
전술 각주(11).
주13
Office Memorandum, To: Allison From: Fearey, Date: August. 3, 1951 (Comments on Korean Note Regarding U. S. Treaty Draft (NARA, RG59, Lot54 D423, JAPANESE PEACE TREATY FILES OF JOHN FOSTER DULLES, Box 8, Korea))※.
주14
JAPANESE - KOREAN REL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ISPUTE CONCERNIMG TAKAESHIMA ISLAND (ANZ, Post-war settlement - Japanese peace settlement – Territorial (Code:R20107058)) )p.9. 2021년도 보고서 게재 자료.
주15
Treaty Changes(NARA, RG59, Records of the Bureau of Public Affairs, Records Relating to the Japanese Peace Treaties, 1946-1952, Lot78 D173 Box2) ※. 2021년도 보고서 게재 자료.
5. 맺음말
호주 외무부의 1951년 7월 25일자 전보 No.32 마지막에는 ‘우리는 초안에 확실히 조선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 섬들을 가능한 한 명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이는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도서가 명확한 표현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미영 실무급 협의의 영국측 방침을 호주가 지지했음을 보여준다.
1951년 6월 1일자 미국 문서에는 미국 초안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견해가 기록되어 있다. 그 견해는 ‘일본 근방의 어느 섬에도 주권 분쟁이 확실히 남지 않도록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보아, 영국 초안 제1조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일본이 보유해야 할 영토를 경위도에 따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16. 1947년 영연방 캔버라 회의에서 제시된 영국 평화 조약의 영토 조항에 관한 방침은 ‘어느 도서도 주권에 대한 분쟁이 남지 않도록 이 조항은 매우 신중한 원안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뉴질랜드도 이 방침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화 조약의 영토 조항 작성 과정에서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이러한 방침이 무시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평화 조약 제2조 (a)에 대하여 미국과 영연방 국가들 간에 이견은 없었으며, 일본이 포기하는 조선에 속하는 섬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뉴질랜드 외무부가 작성한 문서 '일한 관계, 특히 다케시마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중 '다케시마 분쟁' 항목에는 ‘이러한 한국의 불만 시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바라는 뜻대로 제2조 a항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화 조약은 최종적으로 서명되었다(Despite this indication of Korean dissatisfaction, the Peace Treaty was finally signed without amendment of article 2(a) in the sense desired by Korea.)’고 적혀 있다.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남은 것은 연합국의 공통된 인식이었던 것이다.
주16
JAPANESE PEACE TREATY, Working Draft and commentary, June 1, 1951 (NARA, RG59, Central Decimal File 1950-54 Box3009, 694.001/6-151)※.